고태봉 iM증권 본부장 "한국, 생존법은 피지컬AI… 골든타임 남아"
[인터뷰] 한국은 제조업 비중 GDP 24%… AI와 하드웨어 기술 결합 유리
이예빈 기자
4,480
공유하기
 |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24%에 달합니다. AI와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죠. 피지컬AI(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주요 산업 시장을 다른 국가에 뺏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iM증권 본사에서 머니S와 인터뷰를 진행한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뒤처지면 한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뜻한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만큼 피지컬AI 관련 기술과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중장기적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어야만 국내 기업의 주가도 반응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역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피지컬 AI'
 |
고 본부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도 '피지컬AI'라고 봤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을 단순한 정치 갈등으로만 보면 안 된다"며 "본질은 제조 기반 AI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경제·국방·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앞서기 전 선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을 통해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미국 역시 제조업 리쇼어링과 함께 방위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조업 발전 전략이다. 같은 맥락에서 첨단기술이 제조 기반을 통해 현실화하는 과정 속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11%, 중국이 26% 수준이고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이 살아 있다"며 "여기에 AI를 결합하면 피지컬AI 전환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율주행, 방위산업, 로봇 등 각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로템의 K2 전차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등에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국산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술 주권이 없는 AI는 결국 해외 시스템에 종속돼 장기적으로 안보와 시장 모두를 위협할 수 있어서다.
고 본부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은 한국이 충분한 강점을 가진 분야며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핵심 기술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 패권을 쥐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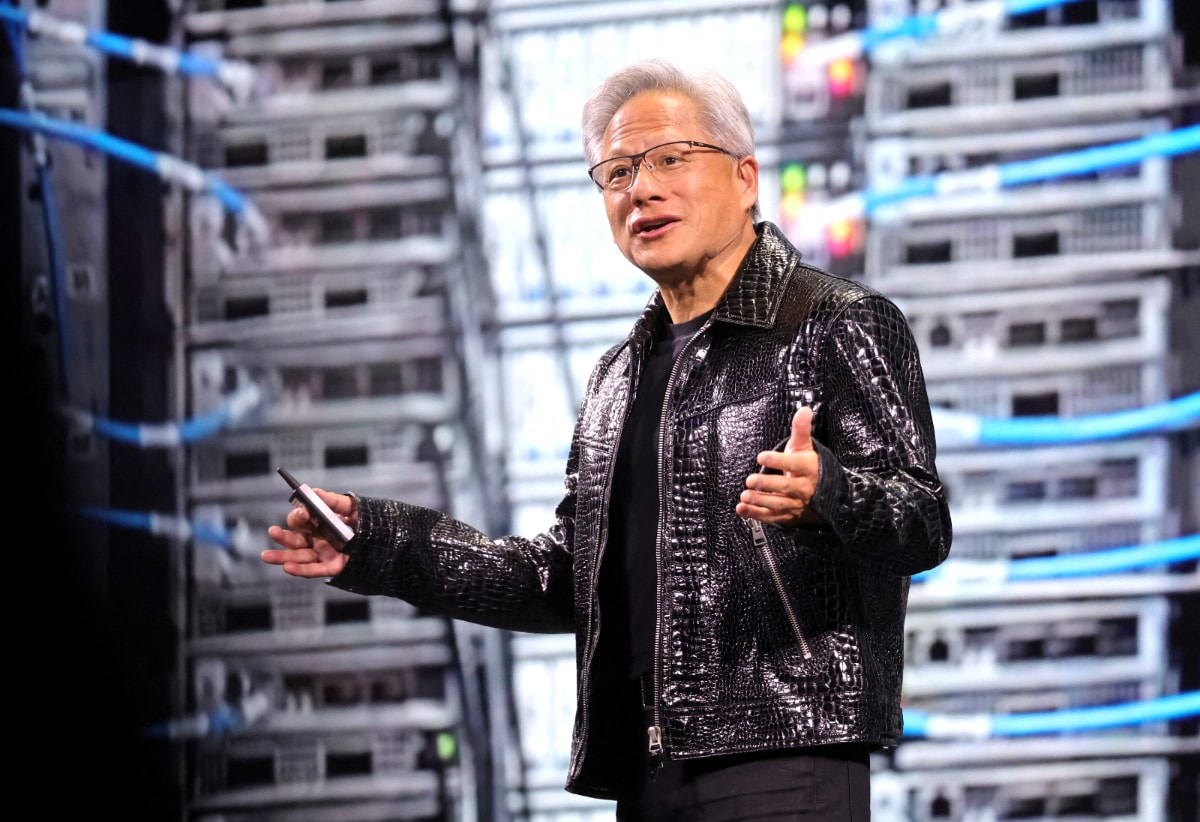 |
피지컬 AI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은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기계가 인간의 판단 없이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하는 시대의 시작"이라며 "이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 패권을 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 예상보다 더디게 발전한 이유로 기존의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이 방식은 인식·제어·매핑 등 기능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는 구조로, 시스템 전반의 최적화가 어렵다.
반면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메라 하나로 도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학습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향후 로봇 산업 등 피지컬 AI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전기차(EV)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에너지 효율성도 필수다. 그는 "자율주행차는 고성능 연산 칩과 다양한 센서, 엣지 디바이스를 동시 구동해야 하므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며 "이에 따라 배터리 기술, 특히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과 효율 문제는 자율주행의 확산을 좌우하며,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혁신과도 직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의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역시 '피지컬 AI'였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하드웨어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AI 부문에서 뒤처진 점이 아쉽다"며 "중국의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만 봐도, AI 통합 능력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성공했지만,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