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조깅에 야간 무급 '체류'?… 한세실업 연장근로제에 '분통'
지난 15일 도입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실효성 의문
결재권자 부재 시 '체류' 야근 속출… 무급에 불만
'시차 관련' 경쟁기업은 유연근무제 등 시행
황정원 기자
공유하기
 |
'새벽 조깅'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세실업이 '연장근로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제도 자체는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방식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근을 신청해도 결재권자가 반려하거나 부재중이면 '체류'로 분류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해서다.
23일 머니S 취재 결과, 한세실업은 이달 15일부터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를 도입했다. 해당 공지는 야근 및 휴일근무 등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야근이 아닌 '체류'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신청은 평일 야근은 당일 오후 5시, 토요일 근무는 전일 오후 5시까지 상사의 결재를 마쳐야 한다. 일요일 및 법정 유급휴일은 신청이 제한된다.
직원들은 이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시차가 큰 해외 법인과의 소통이 잦은 업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전 결재 구조 ▲주 52시간 상한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 ▲그로 인한 무급 야근 발생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급자 승인 없으면 '야근' 아닌 '체류'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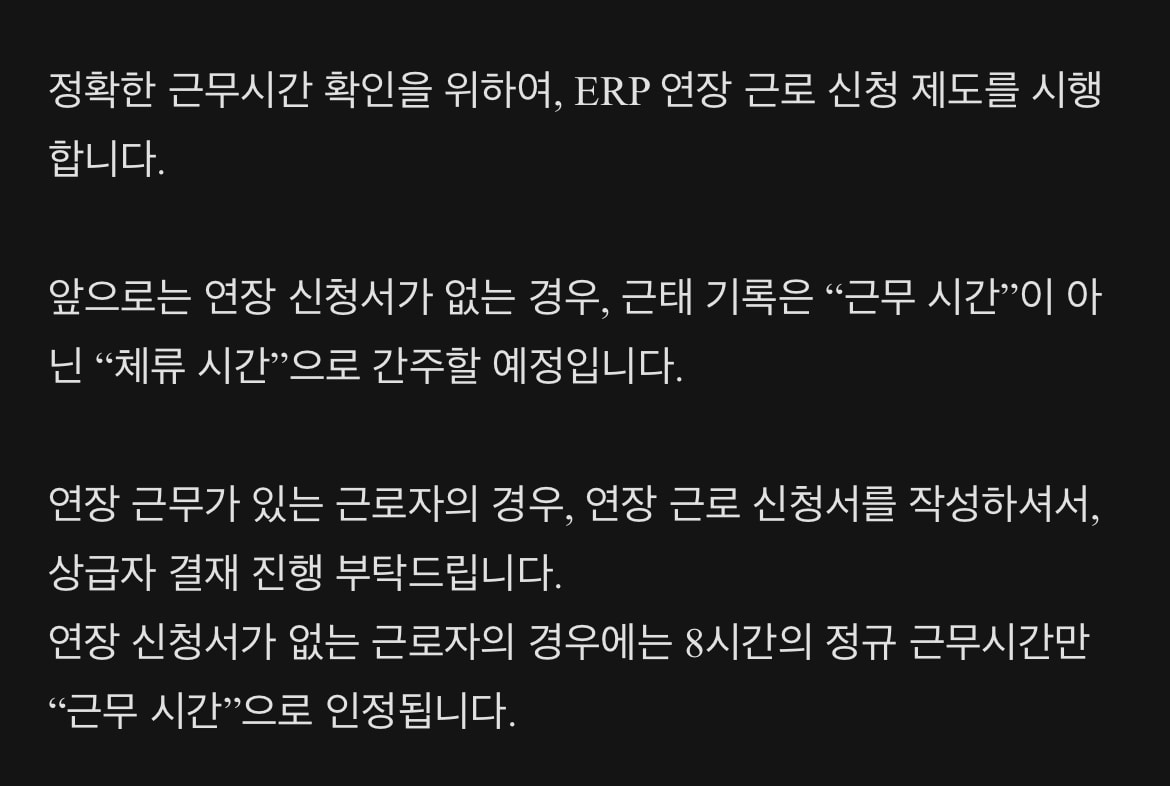 |
한세실업은 베트남, 과테말라 등 시차가 있는 해외 법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직원 A씨는 "공지에는 5시까지 결재를 올리라고 돼 있지만 팀에서는 보통 퇴근 2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요구한다"며 "문제는 야근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갑작스러운 야근 발생 시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에서는 오후 5시가 퇴근시간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오후 3시 정도가 업무 집중 시간이다. 퇴근 직전에 현지에서 급한 건으로 연락이 오는 일이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B씨는 "야근을 신청해도 주 52시간이 넘지 않게 반려한다"며 "수출기업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한데 사전승인제로 장부상 근로시간만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야근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직원들의 '자발적 체류'를 유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직원 C씨는 "팀장 등 결재권자가 일찍 퇴근하거나 외근하면 결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야근하는 모든 직원이 결재 승인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체류'로 간주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노무사는 "연장근로 사전신청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전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종 업계 기업들은 불필요한 야근을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 PC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LF, 세아상역은 교차근무제나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PC오프제를 시행 중인 LF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할 경우 긴급결재 시스템을 통해 팀장 승인 없이도 연장근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세실업 관계자는 "연장근로 신청제도는 고용노동부 권장 사항으로 타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장근로 신청을 미리 결재받기 어렵다는 부분은 팀마다 상황이 달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황정원 기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뉴스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