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에 흩어진 한국인들…'8·15 해방'을 어떻게 기억할까
역사 너머의 해방…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질문들
[신간] 해방의 기억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해방의 기억'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각지에 살았던 한민족이 겪은 8·15 해방, 분단과 연대,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한다. 이에 각국의 교과서, 문학작품, 지역 사례를 통해 공식 기억과 개인적 경험이 교차하는 8.15의 역사를 복원한다.
재만조선인, 재일조선인, 한반도 주민 등이 중국과 일본, 한반도 곳곳에서 경험한 해방의 환희와 공포, 민족 정체성의 위기, 차별과 혐오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특히 8·15 이후 냉전과 분단, 민족 이간 정책, 재일조선인 교육운동, 문학에 나타난 자기 서사 등 미완의 해방과 그 후유증이 중심적으로 다뤄진다.
만주에서는 일부 조선인 친일 세력이 앞잡이로 활동하며 중국인을 멸시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한·중 민족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하는 데 일조했다.
일부 중국인, 특히 20만명에 이르는 토비(土匪)들은 일제의 패망 이후, 조선인에 대한 억눌렸던 분노와 증오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고 폭행이나 약탈, 살해 등을 자행했다.
재일조선인 문학가들은 많은 작품을 ‘자전’, ‘사소설’ 형식으로 발표했다.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지만 나라 잃고 버려지고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온 가족의 역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1948년 전후 일어난 4·24교육투쟁(한신교육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재일조선인은 학교 폐쇄를 우려해 밤마다 당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민족 교육의 의미는 조선학교 폐쇄령 발표 이후에 더욱 커졌다. 이 투쟁은 해방 민족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자 해방 민족의 승리의 결과물이었다. ▷관련기사: [시선의 확장]74년 전 '4월24일'을 기억하며
공저자들은 또한, 8.15를 국경일로만 소비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남과 북, 한중일 코리언이 공유하는 기억과 미래를 함께 성찰한다.
"한국은 분단 트라우마를 기억할 때,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역사적 소재와 서사 구조를 기묘하게 많이 활용했다. 2010년대부터는 왜곡된 미디어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중국과 재중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장되기도 했다"(재중조선족과 한국인의 대담)
‘해방의 기억’은 공식 역사에서 소외된 목소리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선이 돋보이는 인문·사회 교양서다.
△ 해방의 기억/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지음/ 지식의날개/ 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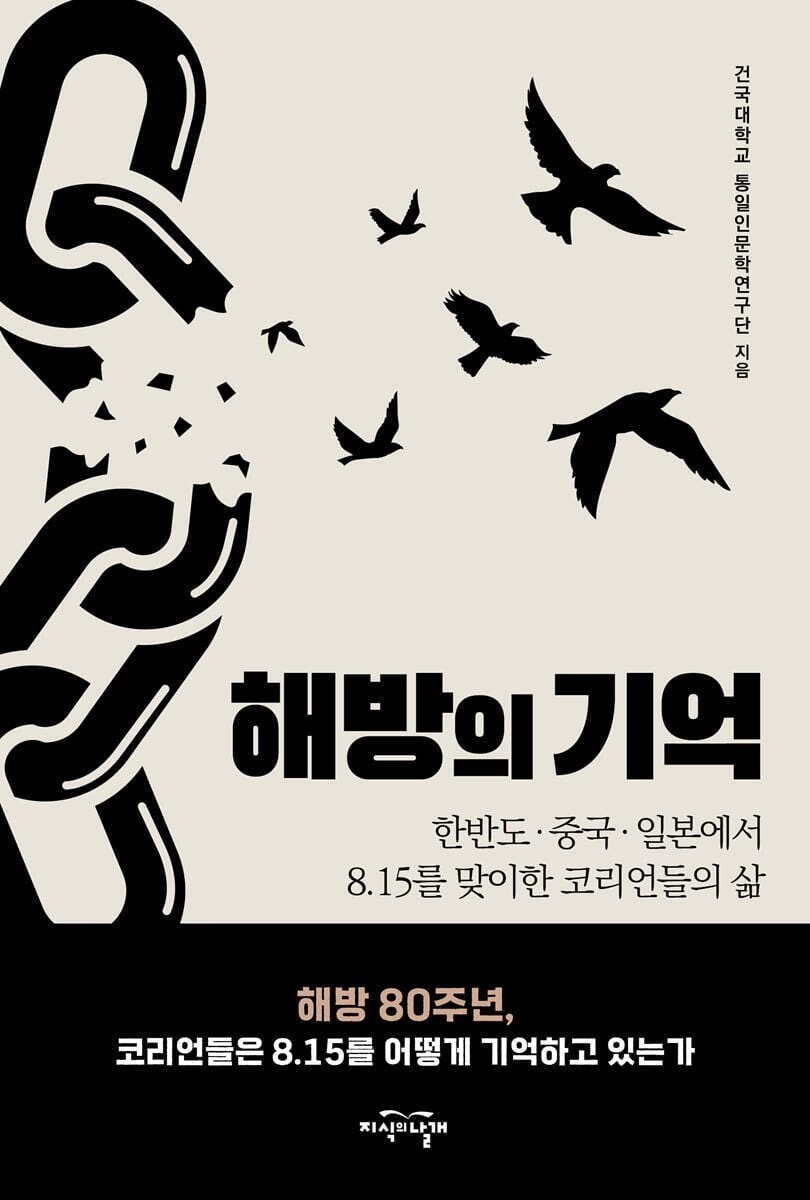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