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걱정할 판에 탄소 감축 왠말"… 철강업계, NDC 발표에 '날벼락'
철강산업, 산업 탄소 배출 1등… "정부 지원 없인 친환경 전환 사실상 불가"
최유빈 기자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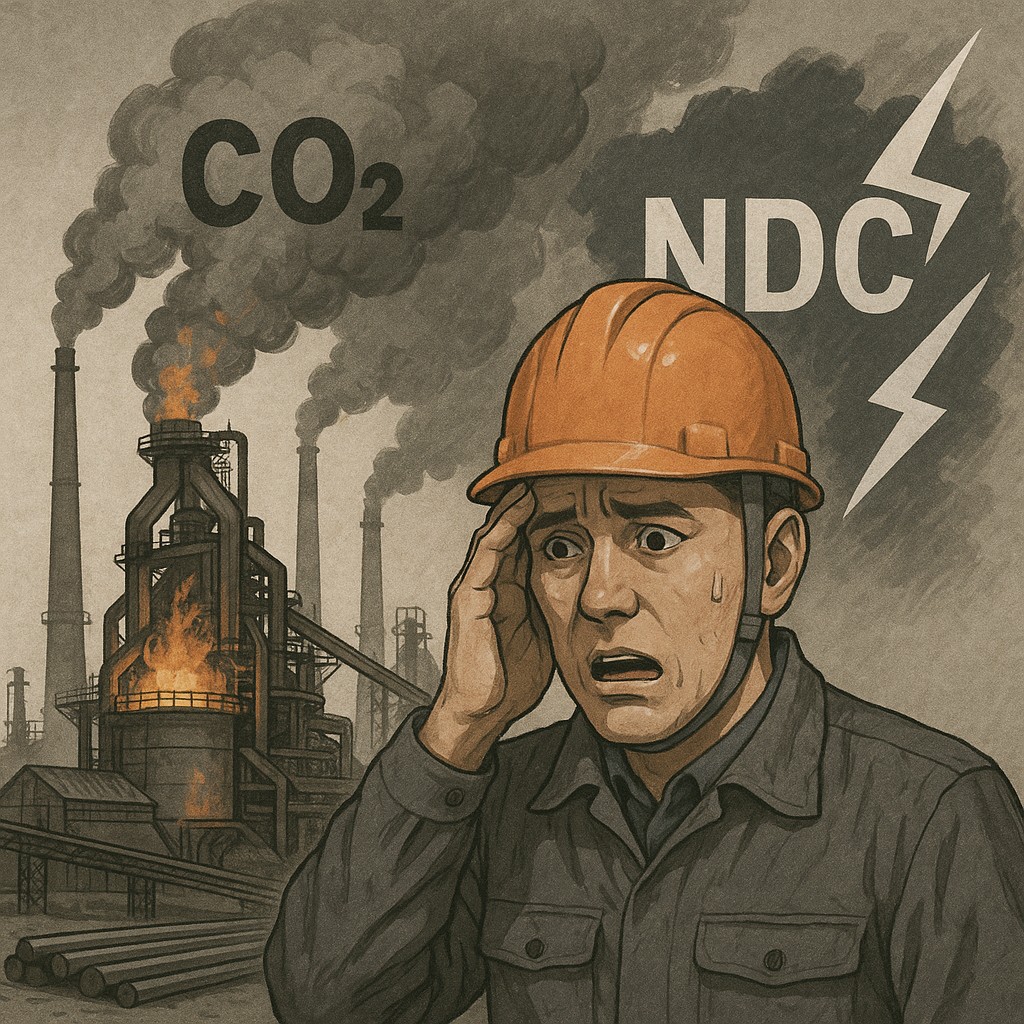 |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에 중국 공급 과잉으로 이미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 부담까지 지게 됐다는 이유다. 시장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철강사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기준으로 2035년 배출량을 3억4890만(53%)~2억8950만톤(61%)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중 산업부문에 할당된 감축 비율은 24~31%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뒷받침된 만큼 산업·에너지 전반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이행 의지를 밝혔다.
철강업계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고 본다. 철강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산업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음에도 배출량은 1억만tCO2eq으로 전년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연구 중인 수소환원제철은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어서 마땅한 감축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감산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떠오르고 있는 전기로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선 "고로는 자동차 강판, 조선 후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전기로는 철근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철강업계로서는 획기적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NDC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며 "저탄소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철강업계의 탄소감축 핵심 기술로 꼽는 수소환원제철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는 포항산단에 파일럿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3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대형 전기로 기술 '하이아크'를 기반으로 자체 수소화원제철 기술 '하이큐브'를 개발 중이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제성은 '그린수소 가격'에 달려 있다. 현재 1㎏당 6~8달러 수준인 그린수소를 1달러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고로 대비 생산비가 2~3배 비싸진다. 에너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 비용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 사례와 비교해도 속도가 뒤처진다. 스웨덴의 SSAB는 HYBRIT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상업생산을 앞두고 있다. 일본 JFE·닛폰스틸도 2030년대 초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상용화 일정은 글로벌 경쟁국 대비 5~7년 뒤처진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친환경 기술 역량 강화가 필수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녹색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선도한다면 '저탄소 철강'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기술개발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와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유통망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액보전 제도나 공공조달·민간수요 지원 등 정책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재윤 실장은 "올해나 늦어도 내년 안에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확정하고 향후 10~1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적 일관성과 강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기업들이 이를 신뢰하고 장기 투자와 감축 노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